
편지도 배달되지 않는 오지 -고마루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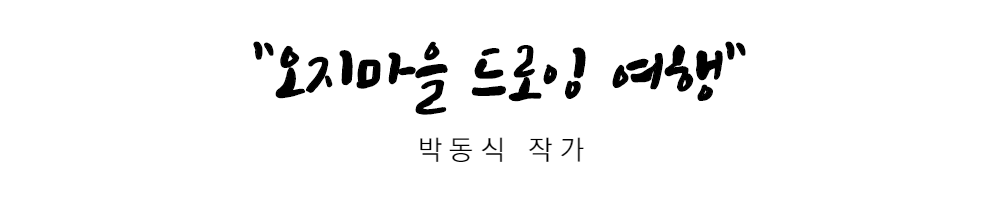
편지도 배달되지 않는 오지 -고마루 마을
평창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고마루’와 ‘조마루’ 두 개의 단어가 맴돌았다. 둘 중 하나는 내가 가야 하는 마을 이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랜차이즈 감자탕집 이름이었다. 몇 번을 되새겨도 자꾸만 헷갈리는 이름. 그래, 깊고 높은 곳에 묻혀 있는 마을, 그래서 고마루. 그렇게 외워야만 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백여 미터를 남겨두고 오작동(?)을 일으켰다. 분명 외길이었는데도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길을 탐색 중’이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로를 안내해주었다. 어차피 되돌아가야 하는 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곳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적당한 곳에서 차를 돌리기 위해 정차했다.
그리고 맞닥트린 기화리 석문. 본래 도로는 석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지만 언젠가 새롭게 터널이 뚫렸고 기화리 석문은 더 이상 차량이 다니지 않는 석문이 되었다. 기화리 석문은 고마루 마을로 가기 위해 어름치 마을 방향에서 올라온다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석문이다.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석문으로 향했다. 눈이 온 지 며칠이나 지났지만, 석문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아직 한 번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 그대로였다. 뽀드득뽀드득 눈을 밟으며 걸었다. 석문 앞에는 낡은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재난위험시설 D등급’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도록 커다란 바위 몇 개로 가로막아놓았다.

다리를 건너고 터널도 지났다. 낙석 위험 안내판이 있었지만 아무 일 없이 무사통과. 석문을 지나자 좌측에는 정자가 있었고 정자 밑으로는 메마른 강이 지나가고 있었다. 놀랍게도 정자 뒤에는 또 하나의 작은 동굴이 있었다. 깊이는 불과 수 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화리 석문과 더불어 마치 쌍 동굴처럼 보였다.
우연히 ‘경로를 이탈해’ 만난 기화리 석문을 뒤로하고 차량으로 되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자 아까 놓쳤던 샛길을 발견했다. 샛길 진입로에는 월동장구를 구비하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세워져 있었다. 길은 비좁았고 이내 양쪽에 장막처럼 높은 산이 나타났고 그 때문에 협곡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차량이 지나간 흔적 위로 조심조심 차를 몰았다. 그리고 만난 마을. 마을이라고 해봐야 서너 채의 집들이 뜨문뜨문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개울 옆 민가에는 백구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묶여 있는 개는 사납다는 편견을 깨버리는 백구였다. 짓기는커녕 연신 꼬리를 흔들며, 수북이 모아놓은 눈구덩이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았다.
그곳이 고마루 마을일 것이라는 추측은 착각이었다. 내비게이션은 ‘고마루’로 시작하는 여러 개의 지명을 보여주었고, 내가 가야 하는 고마루 마을은 이곳에서도 무려 3.5km나 더 들어가야 했다. 내가 넘어야 하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길이었다. 내 차는 사륜구동도 아니고 차량에는 월동장구도 없었다. 그래도 진입해 보기로 했다.
언덕은 가팔랐다. 몇십 미터는 그런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오르막 커브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바퀴는 헛돌았고 뒤로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할 판이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차를 돌려 내려가야 했다. 커브이기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차를 돌릴 수가 없었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량은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았다.
결국, 후진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브레이크를 조금씩 풀어주며 후진을 시작했다. 가파른 언덕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가파를 줄은 몰랐다. 후진으로 내려오는 언덕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였다.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을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대로 미끄러져서 길옆으로 처박힐 것만 같았다. 땀은 삐질삐질 흘렀고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1분 만에 올라갔던 언덕을 무려 15분이나 걸려서 내려왔다. 그래도 무사히 내려온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차량을 밭 귀퉁이에 주차하고 걸을 채비를 차렸다. 백구 옆을 지나며 시멘트 벽면에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우체통을 보았다. 바로 고마루 마을 주민들의 우체통이었다. 고마루 마을은 편지도 배달되지 않는 오지였다. 현관 앞까지 택배가 배달되는 시대에 편지도 도착하지 않는 마을이라니.
구불구불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량을 가져오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행여 커브를 통과했어도 이후 더 가파른 언덕과 더 많은 눈이 쌓인 길을 만나야 했다. 그 길에서는 능선 아래로 차량을 처박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견인 차량 진입도 만만치 않을 테니, 어쩌면 모든 눈이 녹는 봄이 되고서야 차량을 찾으러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마스크가 젖어 들 정도로 숨이 차올랐다. 안경에 너무 많은 김이 차올라 잠시 서서 마스크를 벗었다. 놀랍게도 짧은 순간에 마스크가 얼기 시작했다. 눈 주위를 만져보니 이미 속눈썹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영하 15도가 넘어가는 날씨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길은 오로지 오르고 또 오르기만 했다. 이제는 더워서 속옷이 젖을 정도였다. 한파에 대비해 ‘대장급’ 패딩을 입은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언덕을 오를 때는 불편하기도 했다. 그렇게 모든 언덕을 오르고 평지를 만났다. 고개의 정상이었다. 정상 인근에는 움푹 파인 서너 개의 구덩이가 있었다. 고마루는 카르스트 지대다. 석회암 지형이 오랜 시간 빗물에 녹으면서 지반이 아래로 꺼지는 현상을 ‘돌리네’라고 한다. 고마루 마을 인근에는 이러한 돌리네가 70여 개가 분포해 있다.

정상을 지나자 내리막이 시작되었다. 언덕 아래 마을은 울릉도의 나리분지를 닮아 있었다. 마치 분화구 안에 자리한 마을 같았다. 집은 서너 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도 외지인이 들어서자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아까 만난 백구가 보고 싶어졌다. 개 짖는 소리를 빼면 마을에는 인기척도 없었다.
고마루 마을은 그곳이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언덕을 넘어야 했다. 그래도 첫 번째 언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언덕을 거의 내려갈 즈음이었다.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 한 분이 내려오고 있었다. 복장은 애매했다. 트레킹을 온 외지인 같기도 했고, 작업복 차림으로 마실 나온 현지인 같기도 했다. 일부로 걸음을 늦췄다. 언덕이 끝나는 지점은 갈림길이었고 그곳에서 아저씨를 기다렸다.
“여기가 고마루 마을 끝인가요?”
“아, 저거 넘으면 또 마을 있어요.”
“얼마나 가나요?”
“한 10분?”
그는 고마루 마을 17년 차라고 했다.
“원래 목포 사람인데, 분당에 살다가 내려왔지.”
“귀농, 귀촌 그런 건가요?”
“여긴 환경보호 지역이고 관리 지역이고 그래서 농사도 못 하고, 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 그냥 쉬러 온 거지.”
“가족 다 같이 오신 건가요?”
“가족들은 안 오지. 눈 내리면 사륜차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는 오진데, 누가 제설을 해주나. 완전 고립이라.”
마을에는 그처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가구라고 했다.
세 번째 마을은 언덕 모퉁이 하나를 돌자 바로 나타났다. 결국 고마루 마을은 세 개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세 개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고, 다행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언덕은 수월했다. 마을 끝은 밭을 사이에 두고 T자 모양으로 갈라졌고 양쪽 끝에 각각 한 채의 집이 있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길임에도 길의 끝자락을 밟아보고 싶었다. 밭에는 수확하지 않고 버려졌던 배추들이 하얗게 얼어있었다. 길 끝에 다다랐다. 겨울이고 추웠다. 그리고 눈이 쌓여 있었다. 더는 갈 곳이 없었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두 번째 마을 언덕에서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개 짖는 소리만 듣다가 돌아 나왔을 고마루 마을. 그런 고마루 마을을 되돌아 나오면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다. 하얀 눈밭 위에 선명하게 남은 발자국. 그건 내가 남긴 발자국이었다. 나의 흔적을 되밟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험이었다. 마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았다.
너, 이렇게 언덕을 넘었던 거구나. 새삼 그 발자국이 애틋해졌다.
![]() [오지마을 드로잉 여행]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마을을 여행하며 몇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지만 간혹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지마을 드로잉 여행]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진 마을을 여행하며 몇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지만 간혹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